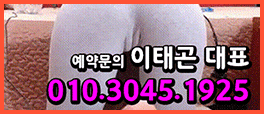아직 난 그녀의 입에서 젖내를 느낀다.. 아 비리고 씁쓸하다.
아직 난 그녀의 입에서 젖내를 느낀다.. 아 비리고 씁쓸하다.
| 다오 | |
| 아영 | |
| 주간 |
-언냐이름 : 아영
-언냐외모 :
성형이 0gram
이 말은 언제가 이 언니도 무르 익으면 얼굴의 어디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.
희소성이 있다고 본다. 탕을 다니며 눈에 익은 어디 병원에서 한지도 알 것같은 그런
이목구비와는 전혀 다르다. 신선하다. 그거 하나로 와꾸는 놓아버렸다.
그렇다고 못났는가.. 그도 아니다. 청순한 여대생, 생과대생 같은 느낌이다.
(생과대는 생활 과학 대학이다. 이과 안의 문과. 여학우 98%의 이과.)
-주/야 : 주간
아영이란 이름은 언제나 초짜란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.
나만 그럴지 모르겠지만, 보통 아영이란 이름을 초짜가 쓰고,
꾸냥이 첫 가게를 뜨면 아영이란 이름을 또 쓰는 걸 본적은 많이 없다.
초짜의 탕명의 영구결번 같은 느낌이랄까.
(이 것 역시 나만의 느낌적 느낌..ㅎㅎ)
아직 자라다 말은 새싹 같은 그녀에게 상큼함이 뿜뿜한다.
거짓말을 많이 보태어 다만세 시절의 티파니를 본다고 하면..
욕을 많이 먹겠지만 내게는 탕방안에서 그 정도의 센세이션은 된다 본다.
대놓고 순진하고, 대놓고 순수하니.
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마냥 누가 괴롭힐라 걱정이 태산..
안그래도 고일대로 고인 이 탕의 세계에는 참~ 안어울리는 듯한
여린 잎 녹차 처럼 진한 내음 따위는 없는 그녀다.
많은 진상과 아픔을 거쳐..
변해버린 너무 어렸던 지명녀가 생각났다.
그녀도 한 순간의 아픔에 갑자기 진한 화장에..
어울리지 않는 란제리를 입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..
가슴 언저리가 아려서 그만.. 보지 않게된 그런 언니인데..
딱 그녀의 첫인상이 겹쳐보이니.. 그저 염려할뿐이다.
하지만 그도 곧 끝나리라. 하얀 도화지일수록 금새 색이 차는 법이다.
그저 그 색이 아름답길 바랄 뿐이다.
이번엔 어떻게 변하던 그저 응원하고 이해하는..
그런 성숙한, 완숙한 탕돌이가 되려한다.
아자 아자!

Comments
 태조이성괴
태조이성괴